지금 한창 LLM 지원 준비(를 뒤늦게) 할 철이라 다들 이것저것 묻거나 자소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마침 주변에 늦깎이 유학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식 자소서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길래 내 자소서를 다시 열어서 보고 보냈다. 그때 완성했을 때는 잘 썼다고(?) 희열이 넘쳤던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니 잘 쓴 부분도 있는데 잘 쓰지 않은 부분도 눈에 들어 온다. 하버드와 다른 학교들은 약간 다른 자소서를 냈었고, 하버드는 다르게 쓴 탓에 시간을 아주 조금 좀 더 많이 들였다. 양쪽 버전을 같이 읽어보니, 역시 완수했다는 그 마음이 참 위험하다는 결론. 하버드가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 낸 자소서를 보니까 왜 승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는지 좀 알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나의 어떤 요소에 꽂혀서 그 부분만 강조해서 쓰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성긴 기분이 든다. 물론 하버드 자소서도 성기지만...다른 학교는 더더욱....! 역시 사람이 성급하게 뚝딱거리면 안된다. 요새 스스로의 급한 성질을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잘 안됨)하고 있다. 하버드 지원일자가 가장 먼저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른 버전이 완성되자마자 다른 학교들에게 자소서들을 다 던져 버렸으니.... 나의 best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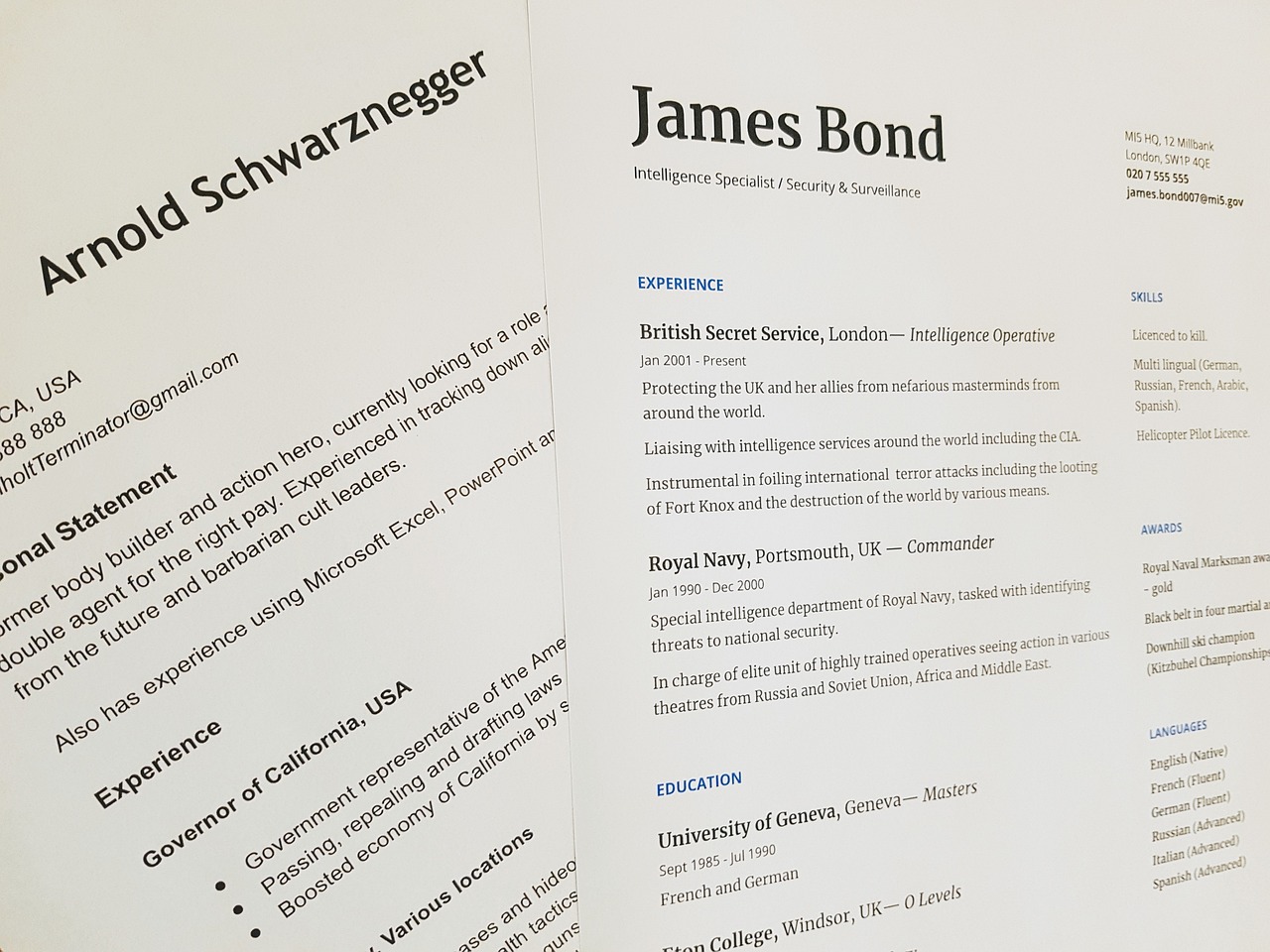
최근에 늦깎이 유학생들(LLM도 늦깎이 유학생이니까) 몇몇에게 조언을 주게 되었다. 조언을 주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1) 우리 모두 미국 입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2) 더 나아가서 계속 "일하면서 글쓰기"에 익숙해져서 자기소개서에 적합한 글쓰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크다. 가장 무난한 자기소개서는 (특히 업무 경력을 뽐내어서 선발되는 한국인 LLM 들의 경우) 자기의 업적 뿜뿜 자랑하고, 이 업적이 있고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날 뽑아라!이다. (a) 영어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b)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가 LLM 인원수가 많고(특히 한국인 인원수가 많고. 예를 들어 UCLA), (c) 꼭 많은 학교에 넣어보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무난한 자기소개서를 써도 충분하다. 그런데 내가 한국인 다른 지원자들 대비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요소를 자꾸 갈아넣어서 나를 어필하게 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LLM 준비를 하면서 실제 미국 Job Market (아카데미아 잡마켓 위주로) 준비하던 친구한테 많은 조언을 얻었는데, 그 친구가 많이 했던 말이 임팩트가 없다는 것이었다. 무난하고 김빠지고 그래서 읽었을 때 별로 남는 게 없는 자소서를 쓰지 말라고 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다. 내 개인적으로 무난하고 김빠지지 않고 그래도 인상깊은 자소서를 쓰려고 했던 노력한 부분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유해봄.
>> 친한 지인에게 나의 컨셉을 물어보자.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기 포장(자기 PR)을 점점 못하게 된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점점 못한다. 회사의 문법이 익숙해질 수록 대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가꾸지를 못하게 된다. 회사의 문법으로 나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니까, 굳이 노력을 더 들여서 갈 필요가 없다.
나도 나의 퀄리티가 무엇인지 말로 표현을 못했고, 그냥 회사의 문법과 언어로만 계속 표현을 했다. 지인들 여럿에게 카톡을 보내서 나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공부나 일에서) 물어봤고, 그걸 써보고, 그 중에 일부를 차용해보고 다듬고 만지면서 내 퀄리티가 무엇인지 정리해나갔다. 정말 친한 지인들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질을 물어본 다음 어떤 컨셉이 좋을지도 물어보고,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좁혀나갔다.
뻔한 말로 나를 PR하게 되면 굉장히 공허해보인다. 결국 가치들의 나열밖에 되지 않고, 변호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퀄리티는 다 나열한 글이 될 수 있다. 왜 그게 나의 퀄리티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매칭하려고 많이 했다.
>> 나 자신의 컨셉을 잡으려고 해보자
다른 글에서 쓴 적이 있는데, 나는 맨 처음에 컨셉을 지방 촌구석에서 도시로 탈출하여 또 미국까지 나아가는 (...) 사람으로 잡았고, 이런 비슷한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모아나"에 꽂혀서 모아나를 컨셉으로 잡았다. 물론 훗날 그 컨셉은 변경되었으나, 여러 경험들이랑 아이디어를 이 컨셉 때문에 다른 앵글로 바라볼 수 있었다.

결국 나도 일을 하면서 계속 내 경험들을 로펌에서의 실적이 되는 viewpoint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버렸고,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어려웠다. 로펌에서 어떤 업무를 해서 그게 실적이 되는 것은 viewpoint가 같은데(이 사건은 시장에서 얼마나 알려졌고, 규모가 얼마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고, 한국 법리를 바꿨고 등등), 컨셉을 정하고 개별 경험을 살펴보니 개별 경험의 의미를 다 다르게 적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은 매매대금은 1조원이지만, 나에겐 1조원의 의미 그 자체보다는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다라던지... 1조원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적절히 한 단어 섞어 주는 식으로 경험들을 엮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컨셉을 수정하고, 다시 경험을 엮은 부분을 수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냈는데, 나는 이 문장이 가장 나를 잘 설명한다고 느껴서 이 컨셉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다.
pushing beyond my limits and boldly striving after what seems impossible
이렇게 마음의 울림이 있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다음 엮어 내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경력이 길면 길수록, 선택하는 것보다 비워내고 쳐내는 것이 더 어렵다.
어제도 친구랑 마구 수다 떨면서, 너에게 중요한 경험 하나만 딱 잡아서 거기서 너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보자고 했다. 처음에 막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늦깎이 학생이기도 한데 예전에도 뭔가 이렇게 뒤늦게 대성하려고 한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Slow starter로 컨셉을 잡아보면 어떻냐, 그리고 (친하니까 예전 경험을 다 아니까) 이러저러한 경험을 녹여서 이렇게 시작해서 마무리 지으면 어떻냐, 나머지 중간에 채울 내용은 이 앵글로 적어보면 어떻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컨셉을 잡았으면, 철저해지자고 했다. slow starter도 결이 모두 다르니까, 내가 어떠한 slow starter인지 (마치 배우가 연기하기 전에 그 캐릭터의 히스토리를 정립하듯이) 생각해보자고 했다. 내가 혼자 생각하려면 멋진 말이 잘 생각 안나니까 인터넷에서 비슷한 만화, 영화, 글 시간 되면 챙겨보자고도 했다. 실제로 내가 한 방법이기도 하다.
'STUDY > 나 LLM 갈 수 있나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LM Scholarship Tip (1) | 2024.06.05 |
|---|---|
| 경고: LSAC에 교환학생 성적표도 내야한다 (1) | 2024.03.02 |
| 요새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 (0) | 2023.07.12 |
| 감사함과 간사함의 사이에서 (2) | 2023.06.15 |
| 자기소개서와 Chat GPT (1) | 2023.04.25 |
| [After admitted] 미국 보험, 과연 어디까지? (0) | 2023.04.21 |